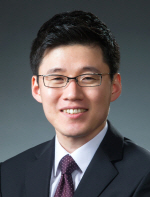[기자의눈]“수입차 A/S는 생떼 쓰는 게 능사?”
*사후관리 소홀이 주는 교훈
기사승인 [2013-01-25 06:03], 기사수정 [2013-05-23 22:09]
|
아시아투데이 최성록 기자 = “이제 수입차 관련자들은 어깨를 펴고 다닙니다. 더 이상 ‘특권층’만을 위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입차가 대중화되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를 만난 수입차 업계 종사자가 했던 말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사장님’ 또는 ‘부자’ 들만을 위한 직업으로 비춰졌던 수입차 딜러들도 오늘날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중적인 직업이 됐다.
올해는 수입차 판매 15만대, 점유율도 12%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 10대 중 1대는 수입차다.
가격이 낮아지고 다양한 소형차들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수입차는 더 이상 과시나 자랑을 위해 타는 차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수입차를 사는데 주저하고 있다. 애프터서비스(A/S) 때문이다.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 “사소한 부품 하나 가는데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면서 수입차를 사려는 소비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수입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매년 새로운 센터를 증설하고 있으며 처리 가능한 자동차 대수를 늘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A/S 처리능력은 한참이 모자라다.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오죽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비자 과실로만 몰기에 생떼를 썼더니 그제야 한 발 물러섰다”며 “정식 센터에 가서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이상한 노하우(?)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1990~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산 가전제품이 국내에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다. 마니아층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산 가전제품은 이상하게 A/S는 유독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잘 팔리는 마당에 굳이 A/S까지는 신경 쓸 일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대신 경쟁 관계였던 국내 가전사는 확실한 A/S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과는 불문가지였다. 일본산 가전제품은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갔고,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잊혀졌다.
이 같은 사례는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7년 첫 진출 이후 25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수입차는 점유율 10%를 달성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