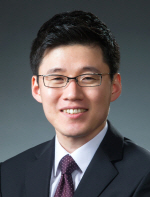[칼럼]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와 제도적 보완
기사승인 [2018-09-13 06:00]
|
최근 경기도 판교에서 ‘제로셔틀’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사람을 태우고 실제 주행을 한다는 소식에 ‘제로셔틀’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상용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율주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전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자동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유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운전 중 발생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신호등이나 제한속도·차선·정지선처럼 일정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 변수도 있지만, 보행자·이륜차·사람이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기상의 변화와 같이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모두 유형화해 통제 가능한 변수들로 전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진정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판교 제로셔틀을 보더라도 주행속도는 시속 25km에 불과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조작을 위한 안전요원도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이 이뤄졌다. 실제 운행 중 안전요원이 개입해 비상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직 주행기술 자체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까지 예측하고 주행을 이어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풀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사람’이라는 변수와 ‘날씨’라는 변수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 가능한 변수들로 만들 수 있을지,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 중인 자동차와 주변 사물과의 상호 소통, 즉 V2X가 필수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사람과의 소통은 기술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기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라면 외부에서도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제한적인 주행 조건 하에서만 자동차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레벨3~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제로셔틀의 경우 규정 속도보다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관계로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의 주행 영역을 트램과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기술임은 틀림없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기술적인 한계들로 인해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숙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